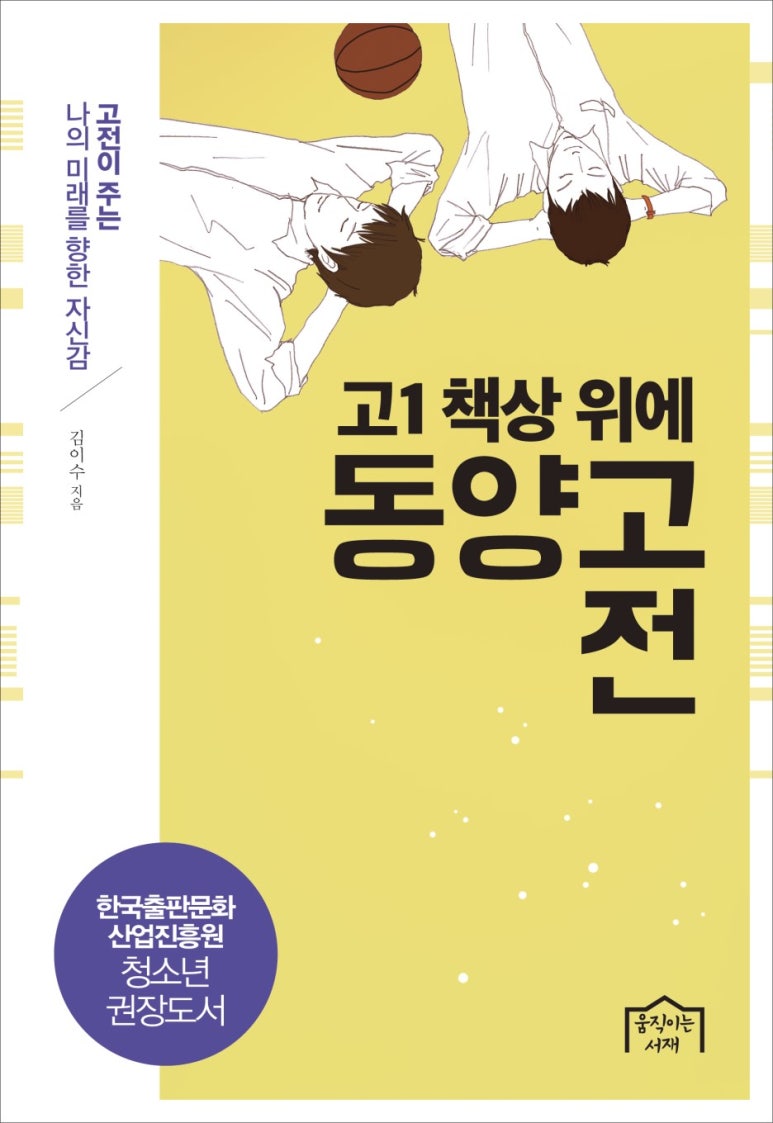자기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성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세(勢)는 세력이라는 말에서 쓰듯이 기세, 혹은 여러 사람의 무리
'한비자'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어!
한비자를 서양의 마키아벨리와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한비자가 군주의 현실적인 자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군주가 부하를 통솔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첫째, 신하의 여러 가지 말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한다.
둘째,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하여 군주의 힘을 보여준다.
셋째,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어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한다.
넷째, 신하의 말을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행하여 성공하도록 강구한다.
다섯째, 신하에게 의심스러운 명령을 내려 그를 시험한다.
여섯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신하에게 묻는다.
일곱째,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본래 원하던 일을 이룬다.
-《한비자》〈내저설(內儲說)〉편 중에서
이 내용은 〈간겁시신(姦劫弑臣)〉편에서 다룬 임금을 죽이는 간사한 신하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다. 간사한 신하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군주가 찬성하는 것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함께 반대하면서 군주의 비위를 맞춘다. 어리석은 군주일수록 자기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신하들을 총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간신들은 군주가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과 나라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므로 결국 군주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군주는 세치 혀로 비위를 맞추려는 간사한 신하들을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시행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한비자는 충고한다.
그리고 훌륭한 군주가 되기위해 갖춰야 할 일곱 가지를 강조했다.
그 일곱 가지는 바로 혁(革), 해(解), 용(用), 법(法), 술(術), 이(理), 세(勢)이다.
혁(革)이란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화해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 변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혁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해(解)로서,
변하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해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하는 현실을 이해한 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인 용(用)은 쓸 용 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과거의 원칙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한비자가 가장 중요시한 법(法)이다. 법이란 각개인의 의지와 판단을 뛰어넘는 원칙이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강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강제성을 가진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 때문이다.
다섯 번째 술(術)은 기술이라는 말에 쓰인다. 단순하게 법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기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칙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은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이(理)이다. 한비자가 도와 함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다. 앞서 한비자가 이야기했듯 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로 끌어안는 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각각의 사물들이 갖는 이유이자 근거이다. 우리는 모든 현실 상황을 전체적인 도의 안목에서 봐야 하고, 동시에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勢)는 세력이라는 말에서 쓰듯이
기세, 혹은 여러 사람의 무리를 뜻한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성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한비자의 이 말은 비단 군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극기심이었다.
자하가 하루는 증자를 만났다. 증자가 말했다.
“어찌 그리 살이 쪘습니까?”
자하가 대답했다.
“싸움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증자가 다시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하가 대답했다.
“집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선왕의 도를 배울 때는 이거 대단하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즐거워했고, 밖에 나와 부귀한 사람들의 환락을 구경할 때도 이거 굉장하구나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 속에서 싸우면서 그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걱정이 되어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왕의 도가 부귀의 즐거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평안하여 이렇게 살이 찐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은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强)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한비자》〈유로(喩老)〉편 중에서
위 이야기에 나오는 자하와 증자는 공자의 제자들로, 스승이 강조한 인(仁)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가 곧 인이라고 했다. 극기복례란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제일 강조한 인이다. 하지만 공자의 사상에 비판적인 한비자는 글의 결론을《도덕경》33장에 나오는 노자의 주장으로 마무리지었다.
知人者智, 自知者明. 勝人者有力, 自勝者强 지인자지, 자지자명.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명석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아기는 자는 강하다.
- 노자《도덕경》33장 중에서
한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공자의 극기(克己), 혹은 노자가 말한 자승(自勝)이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동물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동물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만 충실할 뿐이다.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예를 들어, 피곤하고 졸리면 자고 싶은 수면욕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욕구를 참고 자제해야 할 때가 있다.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인간만이 가진 능력인 ‘반성(反省)적 사고’라고 한다.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을 직시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고전(古典) 읽기이다.
강한 사람이란 힘이 세거나 부와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고 직시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어른이란 이렇듯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어른이다.